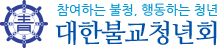달마의 짚신 한짝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영진 작성일10-10-21 17:17 조회6,471회 댓글0건본문
나의 도시 나의 인생] 정선의 돈연 스님(펌)
너의 짚신 한 짝을 찾아 길을 떠나라
돈연(頓然)은 올해로 예순네 살이다. 지금 강원도 정선 부수베리 계곡 초입에 산다. 부수베리는 이곳 사투리로 소나무(부수) 무성한 벼랑(베리)이라는 뜻이다. 그가 사는 집에서 30분만 걸어가면 청정수가 흐르는 계곡이 나온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 백두대간 봉우리 괘병산과 만난다. 돈연은 승려다. 공식적으로는 승려 '였다'.
승보사찰 송광사 교무부장 시절, 외출 나온 광주 시내에서 피비린내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1980년 5월이다. 잘나가는 학승(學僧)으로 전도양양했던 돈연은 2년 뒤 홀연히 보따리를 메고 인도로 갔다. "선방에 앉아서 도를 닦는들, 세상이 그 모양인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라고 했다. 2000km가 넘는 도보 순례를 마치고 정착한 곳이 정선이다. 부수베리는 젊은 날 도법, 수경 등 도반(道伴) 다섯 명이 함께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던 골짜기였다.
돌아와서는 부수베리 옆 가목리에 밭을 만들고 콩농사를 지었다. 메주를 쑤고 된장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다.
겨울이면 송림(松林)은 눈으로 뒤덮였다. "정선은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땅이었다.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비경의 땅이었다. 그게 좋았다."
남정네들은 산에서 베어낸 통나무들로 뗏목을 만들어 여량 아우라지에서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다. 뗏목이 무사히 한양에 닿으면 큰돈이 생겼다. 여인네들은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남정네들 여행을 아리랑으로 배웅했다. 그 뒤에는 통곡(痛哭)이 숨어 있을 절제된 한(恨)이 정선 아리랑에 묻어 있다.
돈연은 가목리 암자에서 젊은 학자들과 함께 불경 번역작업을 시작했다. 조계종 최고의 학승으로 인정받던 그였다. 범어, 팔리어, 한문 그리고 이론에 능한 그가 주도하는 번역 작업은 거침없이 진행됐다. 그런데 1992년 겨울 암자에 불이 나서 5년 동안 작업했던 원고 수천장이 재로 변했다. 세상은 그리 덧없다. 돈연은 껄껄 웃고는 콩밭으로 나가서 밭을 갈았다.
이듬해에 이 범상치 않은 농부가 첼리스트 도완녀와 결혼을 했다. 그로부터 16년 전 괴테문화원에서 함께 독일어 공부를 했던 두 사람이 이러구러 한 세월과 사연 끝에 재회한 것이다.
난리가 났다. 모두가 극렬 반대했다. 돈연이 딱 한마디 했다. "절에 있든 나와 있든 뭐가 다른가."
어찌 말리겠는가. 지금 송광사 주지인 도반 영조 스님이 결혼식 주례를 섰다. "두 번 다시 이처럼 불행한 결혼이 없기를…." 함께 길을 걸어야 할 친구에 대한 아쉬움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렇게 돈연은 파계(破戒)를 감행했다. 여래, 문수, 보현 세 남매가 태어났다.
낮에는 부부가 함께 된장을 만들고, 밤이 되면 돈연은 경전을 읽고 번역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차를 마시고, 된장공장 바깥에 바람이 불면 방안에 촛불 하나 켜놓고 도완녀가 첼로를 연주했다. 대개 그럴 때면 손님들은 조용히 울었다.
사연 깊은 부부가 깜깜한 오지에서 된장을 만든다 하니, 된장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굳어진 '메주와 첼리스트'표 된장이다. 3000개가 넘는 장독이 도열한 공장 앞마당은 그대로 관광명소가 됐다. 부부가 사는 법은 웬만한 잡지, 방송, 신문에는 다 소개됐다.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돈연은 더 이상 된장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부수베리 초입에 집을 짓고 명상을 한다. "잠시 정선을 떠나 경기도 연천으로 공장을 옮긴 적이 있었다. 휴전선을 바라보며 분단에 대한 장시(長時)를 써갔다. 그런데 1980년 광주 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였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 타인은 잘 모른다. 거기에 공장 확장을 하느라 몸까지 지쳐가더니 고혈압, 심장병,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와 2009년 9월 돈연은 쓰러져버렸다. 피폐한 영혼과 고단한 육신을 짊어지고 돈연은 정선으로 돌아왔다. 부와 명예를 안겨줬던 된장과도 절연했다. 대신에 도반들과 함께 초심(初心)을 어루만졌던 부수베리 초입에 집을 지었다. 지금 정선 공장에서 느릿느릿 걸어서 15분 거리다.
그 집에서 돈연은 낮이면 도라지 농사를 짓고 밤에는 석가모니 싯다르타의 일생을 이야기해주는 어린이 불경 번역 작업을 한다. 비구니들이 떠나버린 작은 암자에 가서 기도를 한다. 아내 도완녀는 서울에 산다. "18년 동안 밥을 해주고 된장을 만들고 나를 위해 고생한 사람이다. 더 이상 그녀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건 인권유린이다."
"산문으로 돌아오라"는 도반들 성화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휴가"라고 대답해줬다. 그가 말했다. "희로애락이 다 있는 현실을 떠나 혼자서 성자(聖者)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인생 항로 가운데 2010년이라는 한 시점을 지나고 있을 뿐."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먼 길을 돌던 사내가 출발지로 회귀했다. 손은 텅 비었다. 혹시 또 어디로? 그가 쓴 선시(禪詩)가 대신 답했다. 달마의 짚신 한 짝은 이곳에 있다.
입력 : 2010.10.20 23:32 / 수정 : 2010.10.21 10:37
너의 짚신 한 짝을 찾아 길을 떠나라
난리가 났다, 모두가 극렬 반대했다
돈연이 딱 한마디 했다… "절에 있든 나와 있든 뭐가 다른가."
돈연(頓然)은 올해로 예순네 살이다. 지금 강원도 정선 부수베리 계곡 초입에 산다. 부수베리는 이곳 사투리로 소나무(부수) 무성한 벼랑(베리)이라는 뜻이다. 그가 사는 집에서 30분만 걸어가면 청정수가 흐르는 계곡이 나온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 백두대간 봉우리 괘병산과 만난다. 돈연은 승려다. 공식적으로는 승려 '였다'.승보사찰 송광사 교무부장 시절, 외출 나온 광주 시내에서 피비린내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1980년 5월이다. 잘나가는 학승(學僧)으로 전도양양했던 돈연은 2년 뒤 홀연히 보따리를 메고 인도로 갔다. "선방에 앉아서 도를 닦는들, 세상이 그 모양인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라고 했다. 2000km가 넘는 도보 순례를 마치고 정착한 곳이 정선이다. 부수베리는 젊은 날 도법, 수경 등 도반(道伴) 다섯 명이 함께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던 골짜기였다.
돌아와서는 부수베리 옆 가목리에 밭을 만들고 콩농사를 지었다. 메주를 쑤고 된장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다.
겨울이면 송림(松林)은 눈으로 뒤덮였다. "정선은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땅이었다.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비경의 땅이었다. 그게 좋았다."
남정네들은 산에서 베어낸 통나무들로 뗏목을 만들어 여량 아우라지에서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다. 뗏목이 무사히 한양에 닿으면 큰돈이 생겼다. 여인네들은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남정네들 여행을 아리랑으로 배웅했다. 그 뒤에는 통곡(痛哭)이 숨어 있을 절제된 한(恨)이 정선 아리랑에 묻어 있다.

- ▲ 일러스트=오어진 기자 polpm@chosun.com
이듬해에 이 범상치 않은 농부가 첼리스트 도완녀와 결혼을 했다. 그로부터 16년 전 괴테문화원에서 함께 독일어 공부를 했던 두 사람이 이러구러 한 세월과 사연 끝에 재회한 것이다.
난리가 났다. 모두가 극렬 반대했다. 돈연이 딱 한마디 했다. "절에 있든 나와 있든 뭐가 다른가."
어찌 말리겠는가. 지금 송광사 주지인 도반 영조 스님이 결혼식 주례를 섰다. "두 번 다시 이처럼 불행한 결혼이 없기를…." 함께 길을 걸어야 할 친구에 대한 아쉬움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렇게 돈연은 파계(破戒)를 감행했다. 여래, 문수, 보현 세 남매가 태어났다.
낮에는 부부가 함께 된장을 만들고, 밤이 되면 돈연은 경전을 읽고 번역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차를 마시고, 된장공장 바깥에 바람이 불면 방안에 촛불 하나 켜놓고 도완녀가 첼로를 연주했다. 대개 그럴 때면 손님들은 조용히 울었다.
사연 깊은 부부가 깜깜한 오지에서 된장을 만든다 하니, 된장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굳어진 '메주와 첼리스트'표 된장이다. 3000개가 넘는 장독이 도열한 공장 앞마당은 그대로 관광명소가 됐다. 부부가 사는 법은 웬만한 잡지, 방송, 신문에는 다 소개됐다.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돈연은 더 이상 된장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부수베리 초입에 집을 짓고 명상을 한다. "잠시 정선을 떠나 경기도 연천으로 공장을 옮긴 적이 있었다. 휴전선을 바라보며 분단에 대한 장시(長時)를 써갔다. 그런데 1980년 광주 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였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 타인은 잘 모른다. 거기에 공장 확장을 하느라 몸까지 지쳐가더니 고혈압, 심장병,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와 2009년 9월 돈연은 쓰러져버렸다. 피폐한 영혼과 고단한 육신을 짊어지고 돈연은 정선으로 돌아왔다. 부와 명예를 안겨줬던 된장과도 절연했다. 대신에 도반들과 함께 초심(初心)을 어루만졌던 부수베리 초입에 집을 지었다. 지금 정선 공장에서 느릿느릿 걸어서 15분 거리다.
그 집에서 돈연은 낮이면 도라지 농사를 짓고 밤에는 석가모니 싯다르타의 일생을 이야기해주는 어린이 불경 번역 작업을 한다. 비구니들이 떠나버린 작은 암자에 가서 기도를 한다. 아내 도완녀는 서울에 산다. "18년 동안 밥을 해주고 된장을 만들고 나를 위해 고생한 사람이다. 더 이상 그녀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건 인권유린이다."
"산문으로 돌아오라"는 도반들 성화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휴가"라고 대답해줬다. 그가 말했다. "희로애락이 다 있는 현실을 떠나 혼자서 성자(聖者)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인생 항로 가운데 2010년이라는 한 시점을 지나고 있을 뿐."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먼 길을 돌던 사내가 출발지로 회귀했다. 손은 텅 비었다. 혹시 또 어디로? 그가 쓴 선시(禪詩)가 대신 답했다. 달마의 짚신 한 짝은 이곳에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