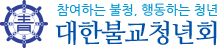고성염불 십종공덕 (高聲念佛 十種功德)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강김영만 작성일11-06-09 07:32 조회12,580회 댓글6건본문
또한 [업보차별경] [대집경] [대승장엄론]에서 모두 큰 소리로 염불하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성염불 십종공덕 (高聲念佛 十種功德)
한국의 사찰에서 조석으로 염송하는 장엄염불 가운데 고성염불 십종공덕이 있다. 큰소리로 염불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열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능히 잠을 없애주는 공덕이 있다.
수면(睡眠)이란 잠이다. 불교에서는 수면을 본능적 번뇌의 일면으로 보고 있다. 즉 수면은 업력의 소산에 의한 습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면이 지나치면 불성계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염불을 하면 수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밝은 각성이 고조되고 수면이 적어짐으로써 정신활동을 고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첫 번째 공덕이다.
둘째. 천마(天魔)가 놀래고 두려워하는 공덕이 있다.
마(魔)는 마라-빠삐마(mara-papima)란 범어의 줄인 음역이다. “마라”는 “죽이는 것” , “죽게끔 하는 것”을 말하고 “ 빠삐마 ”는 “악(惡)”이라 번역한다. 그러므로 마라-빠삐마는 생명을 죽게 하고 악을 조장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런대 선가(禪家)에서는 “마라”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로 보고 있다. 큰소리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염불(念佛) 삼매(三昧)를 얻는다. 이때에 온갖 번뇌가 사라진다. 즉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번뇌, 즉 마라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천마가 놀래고 두려워 한다. ” 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두 번째 공덕이다.
셋째. 염불소리가 온 사방에 두루 퍼지는 공덕이 있다.
일체의 염불은 묘음(妙音)이다. 따라서 염불의 소리는 자신의 수많은 신경과 세포에 진자(震子) 운동을 시킬 뿐 아니라, 공간을 진동시켜 기를 맑게 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음파의 전달로 감동을 주고 마음을 가라앉게 해준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세 번째 공덕이다.
넷째. 삼도(三途)의 고통을 쉬게 하는 공덕이 있다.
삼도(三途)란 지옥, 아귀, 축생을 말한다. 삼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표출될 때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지만 염불은 불을 끄고 화를 가라앉히고 응어리를 삭게 하는 소염제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큰소리로 외우면 참회와 서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삼도의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네 번째 공덕이다.
다섯째.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덕이다.
염불을 할 때에는 입으로는 큰소리로 칭명하지만 귀로는 자신의 소리를 관(觀)하게 된다. 그러면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집중된다. 이러한 원리로 큰소리로 염불하면 그 사람의 귀에는 염불소리밖에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다섯 번째 공덕이다.
여섯째.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공덕이 있다.
큰소리로 염불하면 염심(念心)이 흩어지지 않는다.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일도(一道)경(境)에 든다면 그는 반드시 염심이 흩어지지 않아 삼매(三昧)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여섯 번째 공덕이다.
일곱째. 용맹정진하는 공덕이다.
일념으로 염불을 꾸준히 매일 매일 반복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용맹정진으로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일곱 번째 공덕이다.
여덟째.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공덕이다.
부처님을 일념으로 생각하며 그 명호를 부르는데 어찌 불보살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일심으로 부처님을 창하면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실제는 염불하는 자신의 마음이 순일(純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게 된다.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중생 자신이 곧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여덟 번째 공덕이다.
아홉째. 삼매가 뚜렷하게 들어나는 공덕이 있다.
삼매는 세가지가 어두워진다는 것으로 탐(貪), 진(嗔), 치(癡) 삼독(三毒)심(心)이 잠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탐심이 자면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진심이 자면 자비심이 생기고, 치심이 자면 선정과 지혜가 생긴다. 삼매는 무명이 없어지고 맑고 밝은 마음이 뚜렷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아홉 번째 공덕이다.
열번째. 정토(淨土)에 가서 태어나는 공덕이 있다.
염불수행자가 목숨을 마친 뒤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염불수행자는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의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은 타력적이다. 그러나 불교의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한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오직 일념으로 정진하다보면 그 이치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성염불의 열 번째 공덕이다.
댓글목록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30차 불청 대회에서 500명의 청년불자들이 목탁으로 동시에 염불 수행을
하는 고집멸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에서 웅장하게 법계 유정무정의
세계에 대불청 불자의 발원과 정진의 법희의 장을 생각하며 올려봅니다.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 자명 스님이 말하는 高聲 염불 수행법
“염불소리, 한 옥타브 올려라”
“왜 고성(高聲)염불입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염불하면, 어디 염불이 제대로 됩니까. 높은 소리로 해야지요.”
“높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높은 소리입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톤의 소리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됩니까?”
“고성은 대성(大聲)도 괴성(怪聲)도 아닙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염불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1979년,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돌연 그만두고 불광사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서울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 스님. 그간 지리산 벽송사 등의 선방에서 참선정진하다 서울대·이화여대·포항공대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며 인터넷 포교활동(www.mahaborisa.com)을 해온 스님은 10년 넘게 ‘고성염불수행법’을 출·재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고성염불이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믿고 있다. 고성염불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던 마음속 응어리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물론, 번뇌 망상에 막힌 본래불성(本來佛性)이 높은 소리를 통해 뚫리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높게 외는 염불소리’에서 ‘부처의 소리’를 보게 됐다는 자명 스님. 11월 30일, “고성염불을 통해 자성미타(自性彌陀:자성이 곧 아미타불)를 확인했다”는 스님을 서울 마하보리사에서 만났다. (02)889-2133
▲고성염불수행법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성염불은 소리를 내고 들으면서 염불하는 수행법입니다. 자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주는 행법이지요. 자기가 지은 스트레스, 욕구, 희망사항 등으로 자기 생각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들을 뚫어주는 것이 고성염불입니다.
▲고성염불의 특징은?
-높은 소리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염불소리를 한 옥타브 올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도 단순하고 쉬운 거라서 특별히 특징이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높은 소리’로 염불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소리를 높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은 소리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고성염불과 다른 염불수행법과의 차이는?
-염불수행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토삼부경>이나 아미타불을 쓰고 그리는 ‘사경(寫經)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법신(法身)염불’,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칭명염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염불수행법은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반면 고성염불은 오직 소리의 수행법입니다. 소리 자체가 수행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묵은 감정을 빠져나가게 한 뒤, ‘진리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성염불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벽예불에 올리는 종성문에는 고성염불의 10가지 공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없어지고(能排睡眠) △천마가 두려워하며(天魔驚怖) △염불소리가 주위에 퍼지고(聲邊十方) △삼악도의 고통이 쉬며(三途息苦) △잡다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며(外聲不入)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念心不散)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며(勇猛精進) △제불이 환희하고(諸佛歡喜) △삼매력이 깊어지고(三昧現前) △정토에 왕생(往生淨土)하는 등 바로 고성염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염불의 구체적 행법은?
-관세음보살 다섯 글자를 아주 높은 톤의 음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일정한 리듬을 마쳐 목탁을 쳐가며 시간을 정해놓고 고성으로 반복합니다. 평상시의 소리보다 높여 염불하다보면, 막혀 있던 것이 뚫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소리의 한계가 없어져 자기만의 염불소리를 찾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되면, 유리창 깨지는 소리도 거부감 안 들고 좋아집니다. 스스로 고성염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할 점은?
-수행에서 가장 경계할 큰 병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즐기면 안 됩니다. 염불 소리를 작게 하고 벽만 보고 참선만 한다면, 백발백중 고요한데 머물러 자기 자신을 보기는커녕 그 고요함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고성염불은 혼자서 하면 병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고성이 안 되고 대성(大聲)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지 무조건 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딴 곳으로 빠집니다. 고성염불의 효과가 너무 쉽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마치 눈감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지극 정성 불러야 합니다
출처- 현대불교신문: 2004-12-08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처음 칭명염불을 시작하는 염불인은 소리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며 큰 소리로 염불해야 합니다. 소리에 의지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래하면 공덕이 따를 뿐 아니라 염불하고자 마음을 일으키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연히 염불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피리사 스님의 고성염불]
신라 경덕왕 시대(742~765)의 일입니다. 지금의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곳에 오직 염불 정진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성 안에까지 들려서 360구역 17만 가정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높고 낮음이 없이 낭랑하기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고성염불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일타스님과 고산스님의 고성염불]
소납이 1988년 지리산 쌍계사에서 수학할 때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염불을 배우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열반하신 일타 큰스님과 젊은 시절에 고성염불을 하고자 했으나 대중에게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절 뒤 60여m 되는 삼일폭포 아래서 정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염불하기를 수날을 지나 마침내 득력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큰스님은 염불의 공덕을 강조하시며 대중포교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유익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에 총기가 있어야 하고, 둘째 웃음이 소탈해야 하고, 셋째 목소리가 힘있고 우렁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염불로 정진하면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염불인은 장소가 가능한 곳이면 고성염불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염불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성염불로 업장이 소멸되고 결정된 믿음을 일으키면 관상염불(정토선)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아미타파(http://cafe.daum.net/amitapa/)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제사(諸師)의 법어(法語)와 연종(蓮宗)과 선종(禪宗)
一. 제사(諸師)의 법어(法語)
제사(諸師)가 칭명염불법(稱名念佛法)에 대하여 불법을 설(說)한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선도대사(善導大師)의 말
선도대사는 염불수행에 대하여 전수(專修) 무간수(無間修)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수(專修)]
중생이 업장(業障)이 두텁고 경(境)은 가늘며 마음은 미하여 관법(觀法)을 성취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성(大聖)이 이를 불쌍히 여기사 명호(名號)만 오로지 생각함을 권하셨다.
이것은 이름은 부르기 쉽고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이 잘 되어서 곧 왕생하게 되는 것이니 능히 염념(念念)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여 명(命)이 마칠 때가지 반드시 됨을 기약하면 열이면 열이 왕생하고 백이면 백이 왕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깥의 잡연(雜緣)이 없어서 정념(正念)을 얻게 되고 부처남의 본원(本願)에 서러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순종(順從)하는 까닭이니 이것을 전수(專修)라 한다.
그러나 만약 전수(專修)를 버리고 여러 가지 업(業)을 닦아서 왕생을 구하는 이는 백(百)에 하나나 둘이고 千에 三, 四인 밖에 왕생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잡연(雜緣)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정념(正念)을 잃고 부처님의 본원(本願)과 서로 맞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념(繫念)이 계속하지 못하고 염불을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마음이 없고 비록 업행(業行)은 있으나 항상 명리(名利)와 서로 맞고 잡연(雜緣)에 접근하기를 좋아하여 정토에 왕생함을 스스로 장애(障碍)하는 까닭이다.
[무간수(無間修)]
몸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께만 예배하고 다른 예배는 섞지 아니하며 입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만 부르고, 다른 명호(名號)는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경은 읽지 아니하며 뜻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섞지 아니하며 만일 탐(貪) 진(瞋) 치(癡)를 범하였거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 참회하여 항상 청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간수(無間修)니라.
(2). 영명대사(永明大師)의 말
행자(行者)가 일심(一心)으로 삼보(三寶)에 귀명(歸命)하고 보(報)가 끝나도록 정진(精進)하여 닦되, 앉고 누울 때에 얼굴을 항상 서쪽으로 향하고 행도(行道)예배할 때나 염불 발원할 때에 지성으로 간절하게 하고, 다른 생각은 없는 것이 마치 형장(刑場)에 나갈 때와 같이 옥중에 갇혔을 때와 원수에게 ?길 때와 수화(水火)의 재난을 만났을 때와 같이, 일심(一心)으로 구원을 구하되 빨리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무생(無生)을 증(證)하기를 원하며 함령(含靈)을 널리 제도하고 삼보(三寶)를 융숭(隆崇)하며 사은(四恩)갚기를 서원(誓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성을 다하면 허사가 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말과 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신(信)과 원(願)이 가볍고 적어서 염념(念念)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이 없고 자주 자주 끊어지면서 임종시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업장(業障)이 가려져서 선우(善友)를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뜻밖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괴롭게 굴어 정념(正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이 인(因)이요 임종이 과(果)가 되는 것이니 인이 실하면 과가 허하지 않는 것이 마치 소리가 화(和)하면 울리는 소리가 순하고 형상(形狀)이 곧으면 그림자가 단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3). 연지대사의 말
요점만 가려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악을 멸하면서 염불하는 이를 선인(善人)이라 하고, 마음을 섭수(攝受)하고 산란(散亂)을 제하면서 염불하는 이는 현인(賢人)이라 하고, 마음에 깨닫고 혹(惑)을 끊으면서 염불하는 이를 성인(聖人)이라 한다.
세상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 염불할 수 있으니 염불 법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을 것 없이 일심으로 염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인즉 한 사람도 염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가령 부귀한 사람은 의식이 넉넉하니 염불하기 좋고 가난한 사람은 집이 작고 성가심이 적으니 염불하기 좋고 자손이 있는 사람은 나의 힘을 덜어 주니 염불하기 좋고 자손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염불하기 좋고 무병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니 염불하기 좋고 병 있는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니까 염불하기 좋고
한가한 사람은 마음이 번거롭지 아니하니 염불하기 좋고 바쁜 사람은 바쁜 중에라도 틈을 탈 수 있으니 염불하기 좋고 출가한 사람은 세간을 뛰어 났으니 염불하기 좋고 집에 있는 사람은 이 세계가 화택(火宅)인 줄을 아니 염불하기 좋고 총명한 사람은 정토 일을 잘 아니 염불하기 좋고 어리석은 사람은 별로 능한 것이 없으니 염불하기 좋고 계행을 가지는 사람은 계행이 불법이니 염불하기 좋고 경을 읽는 사람은 경이 부처님의 말씀이니 염불하기 좋고 참선하는 사람은 선(禪 )이 부처님의 마음이니 염불하기 좋고 깨달은 사람은 불도를 증(證)하였으니 염불하기 좋은 것이다.
(4). 우익대사(藕益大師)의 말
염불공부는 다만 진실한 신심(信心)이 귀중한 것이니
첫째로 나는 앞으로 될 불(佛)이요, 아미타불은 이미 이루어진 불(佛)로서 그 체(體)가 둘이 아닌 것인 줄을 믿을 것이고, 둘째로 사바(娑婆)의 고(苦)와 극락(極樂)의 낙(樂)을 믿어서 고를 싫어하고 낙을 구할 것이고, 셋째로 지금의 일거일동이 모두 서방극락세계로 회향(廻向)할 수 있음을 믿을 것이다.
만일 회향하지 아니하면 비록 상품선(上品善)이라도 왕생하지 못하고 회향할 줄 알면 비록 악행(惡行)을 지었더라도 빨리 상속심(相續心)을 끊고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참회하는 힘만으로도 능히 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계(戒)를 가지고 복을 닦는 등 여러 가지 승업(勝業)으로 어찌 정토에 왕생하지 못할 이(理)가 있으랴.
염불 일문(一門)이 百千법문(法門)을 원섭(圓攝)하는데 염불이 정행(正行)이 되고 계(戒) 정(定) 혜(慧) 등이 조행(助行)이 되어 정(正) 조(助)를 합행(合行)하며 순풍을 만난 배와 같을 것이고, 다시 판삭(板索: 곧 널빤지와 밧줄)을 가하면 빨리 저 언덕에 이를 것이다.
염불의 법이 비록 많으나 지명염불(持名念佛)이 가장 간편하고 지명염불법 중에도 기수념(記數念)이 더욱 좋으니라.
자력(自力)으로 혹(惑)을 끊고 생사(生死)를 벗어나는 것을 수출삼계(竪出三界)라 칭하니 일이 어렵고 공(功)이 차차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력(佛力)으로 접인(接引)하여 서방에 왕생하는 것을 횡초삼계(橫超三界)라 칭하니 일이 쉽고 공(功)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다.
혜원조사(慧遠祖師)는
“공(功)이 높고 낳기 쉽기로는 염불이 첫째라” 하였고 경(經)에는 “말세에는 億億 사람이 수행하여도 성도하는 사람이 드물거니와 오직 염불을 의지하면 도탈(度脫)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서 공력(功力)이 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능히 서방의 지름길을 열성 있고 진실하게 믿고 지성으로 발원하며 일심으로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이는 참으로 대장부(大丈夫)라 하려니와 만약 참되지 못하고 원(願)이 간절하지 못하며 행(行)에 진력하지 아니하면 이는 부처님의 대자비(大慈悲)로 주시는 배에 중생이 타기를 즐겨 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라 윤회(輪廻)하는 고를 빨리 벗으려면 지명염불(持名念佛)하여 극락에 왕생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극락에 왕생코자 하면 신(信)을 전도(前導)로 하고 원(願)을 후편(後鞭)으로 함이 가장 필요하니라.
신(信)이 결정되고 원(願)이 간절하면 흩어진 마음으로 염불하여도 반드시 왕생할 수 있거니와 신이 진실치 못하고 원이 지극하지 못하면 일심으로 염불하더라도 왕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信)이란 것은 (1).아미타불의 원력(願力)을 믿고 (2).석가모니불의 교어(敎語)를 믿고 (3).육방(六方)제불(諸佛)의 찬탄(讚歎)을 믿는 것이니 세간의 성인(聖人)군자(君子)도 헛된 말이 없거늘 하물며 아미타불 석가모니불고 육방 제불이 어찌 헛된 말이 있으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참으로 구(救)할 수 없는 것이니라.
원(願)이란 것은 일체 시중(時中)에 사바(裟婆)에서 생사(生死)하는 고를 싫어하고 정토에서 보리(菩提)의 낙(樂)을 좋아하며 선악(善惡)의 지은 바를 따라서 선(善)은 회향(廻向)하여 왕생하며 악(惡)은 참회하여 왕생을 바라고 다시 두 뜻이 없을 것이니, 신과 원이 구비하면 염불은 정행(正行)이 되고 악을 뉘우치고 고치면 선을 닦는 것이 모두 조행(助行)이 되어 공행(功行)의 깊고 얕음을 따라서 구품(九品) 사토(四土)를 나누어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
만약 깊은 신심과 간절한 원력(願力)으로 염불하면서도 염불할 때에 마음이 흩어져 어지러운 이는 하품하생(下品下生)에 날 것이고 염불할 때에 흩어져 어지러운 마음이 점점 적어진 이는 하품중생(下品中生)에 날 것이고 염불이 사일심불란에 이르러 먼저 견혹(見惑) 사혹(思惑)을 끊고 또 능히 무명(無明)을 복단(伏斷)하는 이는 상삼품생(上三品生)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信), 원(願) 으로 지명염불하는 이는 능히 구품(九品)에 왕생함이 틀림없고 또 신, 원으로 지명염불하여 업장(業障)을 없애고 혹(惑)을 띠고 왕생하는 이는 범성동거정토(凡聖同居淨土)에 날 것이고 신, 원으로 지명염불하여 견혹 사혹을 모두 끊고 왕생하는 이는 방편유여정토(方便有餘淨土)에 왕생하고 신, 원으로 지명염불하여 일분(一分) 무명(無明)을 깨뜨린 이는 실보장엄토(實報莊嚴土)에 왕생하고 신, 원으로 지명염불하여 구경(究竟)의 곳(處)에 들어가 무명을 단진(斷盡)한 이는 상적광정토(常寂光淨土)에 왕생할 것이니 그러므로 지명염불이 능히 사토(四土)를 정(淨)하는 것이 또한 틀림없는 것이다.
(5). 육조대사(六朝大師)
[선정쌍수집요(禪淨雙修集要)]에는 옛 적에 한 사람이 육조대사(六朝大師)에게 묻기를 “염불에 무슨 이익이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에
육조대사는 “일구(一句)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이 만세(萬世)의 괴로움을 뛰어나는 묘도(妙道)요, 불(佛)을 이루고 조(祖)가 되는 정인(正因)이요, 삼계(三界)인천(人天)의 안목(眼目)이요, 마음을 밝히고 성(性)을 보는 혜등(慧燈)이요, 지옥을 깨뜨리는 맹장(猛將)이요, 많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베는 보검(寶劍)이요, 五千대장(大臧)의 골수(骨髓)요, 팔만총지(總持)의 중요한 길이요, 흑암(黑暗)을 여의는 명등(明燈)이요, 생사(生死)를 벗어나는 양방(良方)이요, 고해(苦海)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삼계(三界)에 뛰어나는 지름길이요, 최존(最尊) 최상(最上)의 묘문(妙門)이며, 무량무변(無量無邊)의 공덕이니라. 이 일구(一句)를 기억하여 염념(念念)이 항상 나타나고 시시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病苦)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일념(一念)이 분명하면 또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 바 일구미타무별념, 불로탄지도서방(一句彌陀無別念,不勞彈指到西方)이라”하였다.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염불공덕(念佛功德)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여섯 자(字)의 공덕은 다음과 같다.
[나(南)는 항하사성공덕(恒河沙聖功德)이 구족(具足)하다.
[무(無)는 돌아간 七대(代)웃조상이 고(苦)를 여의고 낙(樂)을 얻는다.
[아(阿)는 삼십삼천태허(三十三天太虛)가 진동(震動)한다.
[미(彌)는 무량억겁생사(無量億劫生死)의 죄가 단번에 없어진다.
[타(陀)는 八萬四千마군(魔群)이 갑자기 없어진다.
[불(佛)은 八萬四千 무명업식(無明업業識)이 한꺼번에 없어진다.
염불(念佛)의 종류(種類)
염불법(念佛法)에 실상염불(實相念佛)관상염불(觀像念佛)관상염불(觀想念佛)칭명염불(稱名念佛)의 네가지가 있다
(-)실상염불(實相念佛)은 부처님의 법신(法身)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空)한것도 아닌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이(理)임을 관념(觀念)하는 것인데 이것은 有情)의 업장(業障)이 두터워서 해오(解悟)하는 이가 드문 법이다
(=)관상염불(觀相念佛)은 단정히 앉아서 부처님의 만든상(像)또는 화상(畵像)등의 상신(像身)을 관념하는 것이니 상신이 없어지면 그 관념이 사이가 떨어져 끊어지는 염불법이다
(三)관상염불(觀相念佛)은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의 원만하신 상호(相好)만 상념(想念)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정(有情)의 마음은 굵고 경(境)은 가늘어서 능히 묘관(妙觀)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四)칭명염불(稱名念佛)은 지명염불(持名念佛)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명호(名號)를 염(念)또는 창(唱)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간단하고 수행(修行)하기 쉬우며 왕생하기 쉬운 것이므로 네가지 염불법 중에 손쉬운 방법이다.
[염불의 정인(正因) 조인(助因), 정행(正行) 조행(助行)]
염불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상생활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생업을 버리지 않고 공덕을 얻는 생산적인 도라고 말합니다. 염불은 일과 중이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람을 마주하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르게 염불하는 법을 익혀야 중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여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조석 염불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저녁에 하는 염불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일과에 지장이 없도록 행하고,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하는 염불은 하루를 되돌아 보며 참회하고 의식을 맑게 하기 때문에, 내일을 설계하고 편안한 燒?이루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니다. 대개 40-500분 가량 염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고성염불은 여러가지 공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을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초심자에게는 고성염불이 효과적이지만 오래 익힌 후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공덕이 따르게 됩니다.
염불의 정인(正因)은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깊은 믿음(深心) 혹은 진실신심에 보리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불의 조인(助因)은 칭명 곧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명호를 부르는데는 지성심(至誠心)과 원왕생심(願往生心)으로 해야합니다. 보리심과 더불어 염불의 삼심(三心)이라고 합니다.
칭명염불의 정행(正行)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예배, 공양(찬탄), 독송, 회향(원생회향=왕생을 위한 선행)"하는 것입니다.
관상염불의 정행(正行)은 작원(作願:사마타=止:마음을 정토에 두고 원함), 관상(觀相:비파사나=觀:정토의 경계를 관찰함), 회향심(廻向心:공덕회향=공덕을 베푸려는 마음)입니다.
작원은 원왕생심이 정(定=止)을 이룬 것이고, 관찰은 지성심이 관행(觀行)을 일으킨 것입니다. 관상은 칭명의 공덕을 섭수하되, 그 핵심은 지관(止觀)입니다.
염불의 조행(助行)은 아미타불 외에 다른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예배, 공양, 칭명, 독송"하거나, 다라니를 독송하거나, 육바라밀행을 실천하는 등의 행업입니다. 말하자면 천수경 혹은 반야심경,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다라니를 염송하는 행업 등은 조행입니다.
염불인은 정인과 조인 및 정행(正行)에 힘써야 합니다. 대개 1시간 정도 염불하는 경우에 조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점차 정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수염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불행자는 일상생활에서 염불하면서 일체의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 지혜와 복덕이 증장합니다. 이 마음 밖에 다른 것으로 복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미타파(http://cafe.daum.net/amitapa/)
글 쓴 이 : 백송
보강김영만님의 댓글
보강김영만 작성일
도로아미타불의 참뜻은 무엇인가?
조선 말기에 전국 곳곳에서 아미타불 염불회가 성행하면서 불교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염불의 의미도 모른 채 입으로만 내세의 극락왕생만을
빌고 있다면서 가짜염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십년을 공부해도 헛되이 힘만 쓰며 나무아미타불만 찾는다는 뜻으로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공들인 일이 허사로 돌아갈 때, 혹은 진행하던 일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쓰는 속담으로
도로아미타불(徒勞阿彌陀佛)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눈 밝은 선지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것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임을 밝히고
십념공부 도로아미타불(十念工夫 都露彌陀佛)의 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전에서 말한 참다운 수행법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십념(十念:끊임없이 염불함)을 십년(十年)으로,
도로(都:모두 도, 露:드러날 로)를 도로(徒:한갓 도, 勞:힘쓸 로)로 바꿔
염불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다.
도로아미타불의 참뜻은(?) 우주 만법(萬法)의 근원은 일광(一光)이며,
그 광명이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무량하니 마침내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은
아미타불의 광명정토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한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본다.
비록 세인들이 도(徒)를 무리 도(徒)요 모두 도(都)라 하고
로(勞)는 일할 로, 힘쓸 로(勞)로 바꾸어 비꼬아 쓰고 있는 말이지만
무리 도(徒)란 성인(聖人)들이요 불교에서는 보살들을 말하니 성인들이라는 보살들이
십념(十念)으로 염불하여 수고(勞)한 것들은 모두(都) 아미타불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며
도(都)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都)을 말하고 로(露)는 이슬 로이니
성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깨끗한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都) 아미타불로 드러나게(露) 되어있다는 고백이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르다가 실망하니 도로(徒勞)아미타불이라 하였지만
성인들이 이루어 놓은 진심(眞心)으로 염원(念願)하여 정토(淨土)에 다시 태어나
왕생(往生)하게 되면 모두가 아미타불의 세계이니 이것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요
구원(救援)을 간절히 원하여 일심법(一心法)을 자각하면 다시 생사(生死)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허망한 속담으로 전해오는 도로아미타불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니
부디 성불하여 도로아미타불의 참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0)
'도로아미타불' 의 유래- 1
금강산 장안사에 만송(滿松)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만송스님 문하에 젊은 행자가 한분 있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경학(經學)공부는
가망이 없는지라 석두(石頭)라는 별명으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송 스님은 석두 행자를 달리 가르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왕생극락의 원(願)을 세우고 아미타불만 계속해서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단순하다던가요? 석두 행자도 만송 스님의 지시대로
10년 세월을 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만송 스님이 석두행자에게 편지를 주시며
직지사에 있는 도반에게 전하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금강산에서 직지사까지는 빨리 걸어도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석두 행자는 편지를 건네 받자 즉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달려가다 보니
어느결에 왔는지 직지사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전해 받아 읽고 난 스님께서
석두에게 물었습니다.
"너 언제 장안사에서 출발했더냐?"
"아침 먹고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먹고 출발했단 말이냐?"
"오늘 아침 먹고 출발했습니다."
"그래?"
편지에 기록된 날짜도 분명 오늘 날짜인데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 먼길을 걸어 올 수
있었겠는가? 필시 신력(神力)이 없고서야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스님께서 다시 묻기를,
"네가 무슨 공부를 했더냐?"
"공부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송 스님께서 아미타불만 하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외웠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면 해가 뜨는지 밤이 오는지 모르고, 배가 고프고 춥고 더운 것도 모릅니다.
잠속에서 꿈을 꾸어도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도
아미타불만 부르고 오니 강을 건넜는지 산을 넘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렇겠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명호니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고 의지한다는 뜻의 "나무"를 넣어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석두 행자는 10년을 "아미타불"만 해오던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갑자기 "나무아미타불"을 하자니 혼동이 되어 되돌아오는 길에서 염불을 하다가
자주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하다가 다시 "아미타불"로 바꾸고 또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에는 일주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만송 스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냐고 묻자,
"아미타불과 나무아미타불을 섞어서 부르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이고 나무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다."
만송 스님의 이 말씀에 석두가 깜짝 놀라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도로 아미타불이네요. 그렇다면 그 타불이나, 이 타불이 똑 같듯이
나도 과거에는 아미타불이었네."하고 외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석두는 스스로 간직하고 있던 자성미타(自性彌陀)를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도로아미타불"은 석두 행자의 오도송(悟道頌)일 수도 있고
잃었던 자기 자신의 불성을 되찾았다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지장보살"을 부르던,"나무아미타불"을 부르던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르다 보면 저 석두행자처럼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부처님을 뵈올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