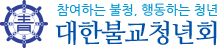[ 반야심경 ] 보살(菩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1-16 13:58 조회5,472회 댓글0건본문
Ⅰ. 반야심경의 개관
Ⅱ. 경의 제목
Ⅲ. 경의 실천적 해설
1장. 반야심경의 구성방식
2장. 관자재(觀自在)
~~~~~~~~~~~~~~~~~~~~~~~~~~~~~~~~~~~~~~~~~~~~~~~~~~~~~~~
3장. 보살(菩薩)
‘관자재보살’에서 ‘보살’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범어로 ‘보디사트바(Bodhisattva)’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리'와,
중생을 뜻하는 '사트바'를 합한 단어로서,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갖춘 자가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이는 보살의 서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보살의 한결같은 서원인 것입니다.
물론 아래다, 위다 하는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후(先後), 고하(高下)의 상대 개념이 아닌,
분별이 끊어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나중이라고 할 것 없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려 하면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행이며,
보리를 구함이 바로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대비원력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행을 흔히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이익 되게 함이 곧
타인, 이웃을 이익 되게 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인생을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고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이며,
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연기의 진리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고
깨달음이라는 크나큰 포부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이웃을 위해 부단히 희생하지만
희생한다는 상이 없으며,
부단히 궁극의 자기 향상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대지도론』의 보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나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는 이때부터 보리살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발심을 일으킨 자가 바로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의상조사법성게』를 보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란 말이 있듯이,
처음 발심한 이의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 바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보살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너무 멀게만 느끼던 우리들에게
나도 보살이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을 내고 원을 세우면
바로 ‘보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대승불교의 활짝 열린 보살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는 세상이 바로 ‘큰 탈 것[大乘]’이라는
대승불교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인 것입니다.
보살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나투어
우리를 이익 되게 해 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분의 보살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에서부터,
어려운 이웃, 심지어 축생들에서부터 자연만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보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는 ‘하나’라는 깨달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를 통틀어 이르는 단어가 바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살은
중생 구제(하화중생)와 자신의 닦음(상구보리),
포교(이타)와 수행(자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떤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보완적이며,
결국은 하나의 길에 대한 두 가지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불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포교, 교화, 전법(傳法)에 대해서
불교인들은 다소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의 공부, 수행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일러주고 포교하는 것에는
너무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포교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교의 힘이 바로 수행력(修行力)이요,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닫고 난 뒤에, 부처된 뒤에 포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바로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남을 위해 한 마디라도 일러주는 그것
Ⅱ. 경의 제목
Ⅲ. 경의 실천적 해설
1장. 반야심경의 구성방식
2장. 관자재(觀自在)
~~~~~~~~~~~~~~~~~~~~~~~~~~~~~~~~~~~~~~~~~~~~~~~~~~~~~~~
3장. 보살(菩薩)
‘관자재보살’에서 ‘보살’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범어로 ‘보디사트바(Bodhisattva)’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리'와,
중생을 뜻하는 '사트바'를 합한 단어로서,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갖춘 자가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이는 보살의 서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보살의 한결같은 서원인 것입니다.
물론 아래다, 위다 하는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후(先後), 고하(高下)의 상대 개념이 아닌,
분별이 끊어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나중이라고 할 것 없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려 하면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행이며,
보리를 구함이 바로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대비원력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행을 흔히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이익 되게 함이 곧
타인, 이웃을 이익 되게 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인생을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고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이며,
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연기의 진리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고
깨달음이라는 크나큰 포부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이웃을 위해 부단히 희생하지만
희생한다는 상이 없으며,
부단히 궁극의 자기 향상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대지도론』의 보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나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는 이때부터 보리살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발심을 일으킨 자가 바로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의상조사법성게』를 보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란 말이 있듯이,
처음 발심한 이의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 바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보살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너무 멀게만 느끼던 우리들에게
나도 보살이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을 내고 원을 세우면
바로 ‘보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대승불교의 활짝 열린 보살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는 세상이 바로 ‘큰 탈 것[大乘]’이라는
대승불교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인 것입니다.
보살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나투어
우리를 이익 되게 해 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분의 보살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에서부터,
어려운 이웃, 심지어 축생들에서부터 자연만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보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는 ‘하나’라는 깨달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를 통틀어 이르는 단어가 바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살은
중생 구제(하화중생)와 자신의 닦음(상구보리),
포교(이타)와 수행(자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떤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보완적이며,
결국은 하나의 길에 대한 두 가지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불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포교, 교화, 전법(傳法)에 대해서
불교인들은 다소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의 공부, 수행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일러주고 포교하는 것에는
너무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포교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교의 힘이 바로 수행력(修行力)이요,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닫고 난 뒤에, 부처된 뒤에 포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바로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남을 위해 한 마디라도 일러주는 그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