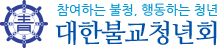[ 반야심경 ] 제법무아(諸法無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1-16 14:08 조회6,696회 댓글0건본문
“수루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체는 불변하느냐, 변하느냐?”
“세존이시여, 변하나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관찰하여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법’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일체 모든 것을 의미합니
다.
제행무상에서의 ‘제행’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무아’는 일상 생활에서 ‘나’라는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현상도 다른 현상과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마’라는 비구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여러 비구가 병 문안을 왔다.
“어떤가? 견딜 만한가?”
“어찌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네.”
그때 한 비구가 그를 위로하고자,
“세존은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셨던가?”
하니, 차마는,
“나는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네.” 라고 대답했다.
여러 비구들이 따지고 들자, 차마는 말했다.
“벗들이여, 내가 ‘나’는 있다고 한 것은, 이 신체가 ‘나’라는 뜻은
아니라네.
또, 감각이나 의식을 가리킨 것도 아니라네.
또, 그것들을 떠나서, 따로 ‘나’가 있다는 의미도 아니네.
벗들이여, 예를 들면 꽃의 향기와 같다네.
만약 어떤 사람이,
꽃잎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줄기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또는, 꽃술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역시 향기는 꽃에서 난다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나 감각이나 의식을 ‘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그것을 떠나서 따로 ‘나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네.
나는 그것들의 통일된 형태를 ‘나’라고 하는 것이라네“
무아라는 말은 ‘아(我)가 없다’,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즉, 고정 불변한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상을 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이 없는데,
내 것이라는 것과,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
니다.
‘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속성인 상일성(常一性)이 있어야 하고,
나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재성(主宰性)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로 항상해야 참된 ‘나’라고 할 수 있지
늘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나’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속성, 즉 상일성과 주재성을 가져야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하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100년도 못 되어 완전히 변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하는 상일성이 없으므로 무아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서라도 결정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 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마음 기쁘고 싶다고 기쁠 수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연따라, 상황따라 그렇듯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행복, 불행, 고독, 허탈 등등의 마음을 오고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이처럼
상일성도 주재성도 없는 텅 비어 있고 실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상일성과 주재성이 없는 ‘나’는 더 이상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아라고 하여,
현재의 나, 현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 불변하는 실체적인 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진리는
연기의 공간적인 표현이며, 내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이고 공간적인 관찰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하지 않는 존재, 연기하는 존재를 가지고
‘나다’ 라는 생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이며,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일체제법이 생주이멸하는 마당에
어느 무엇을 잡아 ‘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치 불교는
나를 무시하는 종교이며
“세존이시여, 변하나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관찰하여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법’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일체 모든 것을 의미합니
다.
제행무상에서의 ‘제행’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무아’는 일상 생활에서 ‘나’라는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현상도 다른 현상과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마’라는 비구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여러 비구가 병 문안을 왔다.
“어떤가? 견딜 만한가?”
“어찌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네.”
그때 한 비구가 그를 위로하고자,
“세존은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셨던가?”
하니, 차마는,
“나는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네.” 라고 대답했다.
여러 비구들이 따지고 들자, 차마는 말했다.
“벗들이여, 내가 ‘나’는 있다고 한 것은, 이 신체가 ‘나’라는 뜻은
아니라네.
또, 감각이나 의식을 가리킨 것도 아니라네.
또, 그것들을 떠나서, 따로 ‘나’가 있다는 의미도 아니네.
벗들이여, 예를 들면 꽃의 향기와 같다네.
만약 어떤 사람이,
꽃잎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줄기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또는, 꽃술에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역시 향기는 꽃에서 난다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나 감각이나 의식을 ‘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그것을 떠나서 따로 ‘나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네.
나는 그것들의 통일된 형태를 ‘나’라고 하는 것이라네“
무아라는 말은 ‘아(我)가 없다’,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즉, 고정 불변한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상을 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이 없는데,
내 것이라는 것과,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
니다.
‘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속성인 상일성(常一性)이 있어야 하고,
나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재성(主宰性)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로 항상해야 참된 ‘나’라고 할 수 있지
늘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나’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속성, 즉 상일성과 주재성을 가져야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하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100년도 못 되어 완전히 변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하는 상일성이 없으므로 무아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서라도 결정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 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마음 기쁘고 싶다고 기쁠 수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연따라, 상황따라 그렇듯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행복, 불행, 고독, 허탈 등등의 마음을 오고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이처럼
상일성도 주재성도 없는 텅 비어 있고 실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상일성과 주재성이 없는 ‘나’는 더 이상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아라고 하여,
현재의 나, 현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 불변하는 실체적인 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진리는
연기의 공간적인 표현이며, 내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이고 공간적인 관찰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하지 않는 존재, 연기하는 존재를 가지고
‘나다’ 라는 생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이며,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일체제법이 생주이멸하는 마당에
어느 무엇을 잡아 ‘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치 불교는
나를 무시하는 종교이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