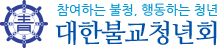[ 반야심경 ] 연기법(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1-16 14:07 조회6,432회 댓글0건본문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색(色)과 공(空)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데,
색이란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며,
오온[색수상행식] 중에서 물질적 개념인 ‘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空)이라고 하면,
앞에서 누차 설명했던 연기, 중도,
무자성(無自性)의 의미로서의 공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쓰인 ‘공’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의미의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모였으므로 인과 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공이 곧 연기’라는 논리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에는 시간적 개념에서 바라본 연기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이치가 있고,
공간적 개념에서 바라본 연기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행무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며,
제법무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본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과
삼법인의 제행무상, 제법무아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론에 앞선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불교의 근본사상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연기법이라 할 수 있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우루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인 것입니다.
『소부경전』의 우다나 편에 보면,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의혹이란,
생사에 대한 의혹, 일체에 대한 궁금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에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고,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고 말하십니다.
즉 생사의 매듭이 풀리고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일체 존재의 실상을 연기를 통해 깨쳤다고 한 것입니
다.
『중아함경』 제 7 권에서는 연기를,
연기를 보면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바로 연기를 본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으며, 『잡아함경』 제 12 권에서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항상 존재한
다.
여래는 이 법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해서
중생을 위해 분별 연설하며 깨우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팔리어로 ‘Paticca-Samuppada'' 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말미암아, 때문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기의 내용[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의 기본공식]은 과연 무엇인
가?
『잡아함경』 권 15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 彼有]
- 공간적 상의성 [無我]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此生故 彼生]
- 시간적 상의성 [無常]
이는 다시 말해,
일체의 모든 것들은 항상 무엇과 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함께 공존하며, 함께 변해가고,
이윽고 함께 의존하여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주이멸(生住離滅), 성주괴공(成住壞空)].
즉, 우리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과 저것을 갈라놓고,
나와 남을 갈라놓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것이 바탕 되어 일어나며,
나는 남을 의지하여, 남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변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유 방법은 그 당시에는 새로운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자기 친구에게 비유로써 연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여기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있다고 하자.
그 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을 때는 서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 묶음에서 어느 하나를 떼어 낸다면
다른 한 쪽은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연기법이란,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서로 상의상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존재는
이 우주 만유와 서로 영향을 주
그러나,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색(色)과 공(空)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데,
색이란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며,
오온[색수상행식] 중에서 물질적 개념인 ‘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空)이라고 하면,
앞에서 누차 설명했던 연기, 중도,
무자성(無自性)의 의미로서의 공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쓰인 ‘공’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의미의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모였으므로 인과 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공이 곧 연기’라는 논리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에는 시간적 개념에서 바라본 연기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이치가 있고,
공간적 개념에서 바라본 연기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행무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며,
제법무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본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과
삼법인의 제행무상, 제법무아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론에 앞선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불교의 근본사상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연기법이라 할 수 있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우루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인 것입니다.
『소부경전』의 우다나 편에 보면,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의혹이란,
생사에 대한 의혹, 일체에 대한 궁금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에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고,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고 말하십니다.
즉 생사의 매듭이 풀리고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일체 존재의 실상을 연기를 통해 깨쳤다고 한 것입니
다.
『중아함경』 제 7 권에서는 연기를,
연기를 보면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바로 연기를 본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으며, 『잡아함경』 제 12 권에서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항상 존재한
다.
여래는 이 법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해서
중생을 위해 분별 연설하며 깨우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팔리어로 ‘Paticca-Samuppada'' 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말미암아, 때문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기의 내용[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의 기본공식]은 과연 무엇인
가?
『잡아함경』 권 15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 彼有]
- 공간적 상의성 [無我]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此生故 彼生]
- 시간적 상의성 [無常]
이는 다시 말해,
일체의 모든 것들은 항상 무엇과 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함께 공존하며, 함께 변해가고,
이윽고 함께 의존하여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주이멸(生住離滅), 성주괴공(成住壞空)].
즉, 우리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과 저것을 갈라놓고,
나와 남을 갈라놓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것이 바탕 되어 일어나며,
나는 남을 의지하여, 남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변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유 방법은 그 당시에는 새로운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자기 친구에게 비유로써 연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여기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있다고 하자.
그 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을 때는 서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 묶음에서 어느 하나를 떼어 낸다면
다른 한 쪽은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연기법이란,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서로 상의상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존재는
이 우주 만유와 서로 영향을 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